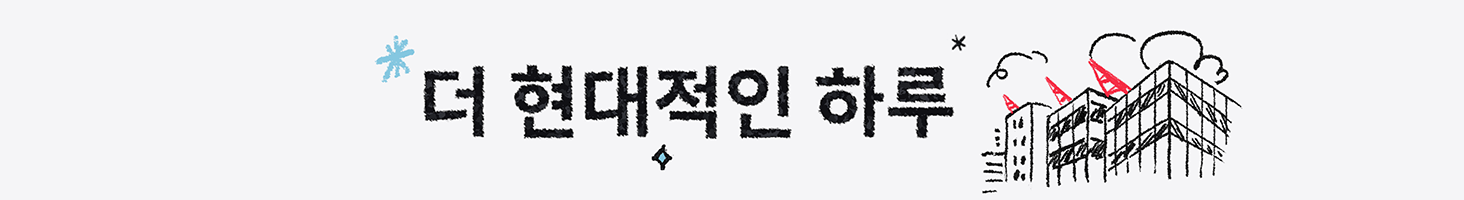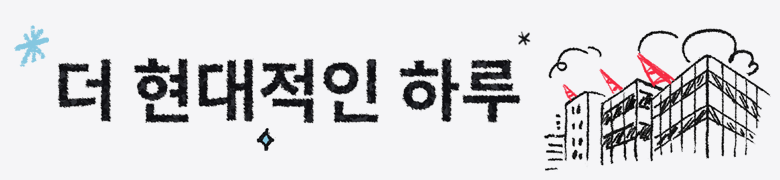TK is the New Black (3)
한국 현대미술을 오랜 시간 관찰해온 평론가, 서울 태생, 경계성 아스퍼거 증후군, 커밍아웃한 바이섹슈얼인 임근준(이정우)이 경계 밖의 시선으로 대구·경북 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조망합니다. 대구·경북의 미술을 향한 특별한 애정을 전제로, 객관적인 동시에 편파적으로.

1910년대: 너무나 낯선 이국 같은 우리 근대 서화의 시작
대구·경북 지역 현대미술의 역사에서 당당하게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근대 서화 운동의 전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추상 미술 운동의 역사다. 그렇기에 오늘날 한국화가 처한 위기 상황에 비춰보면, 선대의 개척자들과 그들이 일군 가치가 다소간 잊히고 있는 현실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한다.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일본 식민지 시대의 흐름은 편향적으로 조명되어온 측면이 있다. 그렇기에 평안남도 중화 태생의 해강 김규진과 그가 이끌던 서화연구회의 흐름, 그리고 호남의 새로운 남종화 탐구 경향, 즉 조선 후기의 화가 소치 허련의 화풍을 계승했다고 알려진 의재 허백련과 남농 허건의 운림산방 화계畵界 등은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하는 일이 드물다. 아무래도 역사의 주도권이 서화협회의 인맥을 중심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편향이 생기고 말았다.
평안도 태생의 서화가 수암 김유탁이 1906년 최초의 상업 화랑으로 일컫는 수암서화관을 연 일이나 황해도 해주 태생의 애국지사 오세창이 역대 서화가를 조사·정리하고 옛 글씨와 그림을 수집·연구해 그 성과를 1917년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의 초본으로 정리한 일들이 지닌 역사적 의의 등을 이야기하면 한국화를 전공하는 학생들조차 심드렁한 표정을 짓는다. 이렇듯 우리의 과거는 너무나 낯선 이국으로 남아 있다.
* 이후 1928년 계명구락부에서 출간한 <근역서화징>은 근대 이전의 서화가 1,117명의 기록과 해제를 담고 있다. 오세창은 간송 전형필이 소장선을 구축하고, 1937년 보화각(간송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기도 한 인물. 이 수집·감식가 시대의 역작은 이후 정식 미술사학자들이 활동하는 데 발판 역할을 한다.
한국화를 전공하는 학생들조차 심드렁한 표정을 짓는다.
이렇듯 우리의 과거는 너무나 낯선 이국으로 남아 있다.
1920년대: 전통 서화를 현대화하다
서울의 개화기 중인 집안에서 태어난 고희동이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던 1915년 김규진은 서화미술회와 대비되는 서화연구회를 설립했다. 당시 여성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서화가는 소수에 불과했는데, 그는 평안도 모더니스트답게 여성도 수강생으로 받아들였다. 서양화·동양화 등의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역시 1915년으로, 조선총독부가 주최한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가 열리면서부터다. 이때 경복궁에 조선총독부미술관*도 개관했다.
* 해방 이후 경복궁미술관으로 개칭해 국전을 주최했고, 이로부터 1969년 국립현대미술관도 출범했다.


1921년 서화협회가 처음으로 협회전을 열 때, 최초의 미술 전문지 <서화협회보>도 창간됐다. 그런데 바로 이듬해인 1922년 서병오 등이 대구에서 교남시서화연구회를 조직한다. 조선총독부의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가 열리기 직전이었다. 이규채와 김권수가 서울 공평동에서 최초의 여성 서화 교육기관인 창신서화연구회(규수서화연구회)를 설립한 것도 1922년이었다. 이상범·노수현·이용우·변관식이 동연사同硏社*를 결성하고 전통화의 현대화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은 1923년이었으니, 이 시기는 현대적 서화 운동의 결정적 발흥기인 셈이다.
*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화 동인회.
이렇게 서화 전통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다종다양한 흐름은 서양화를 조선화·토착화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1928년 박광진·김주경·심영섭·장석표 등은 서양 현대미술의 토착화를 주장하며 녹향회綠鄕會*를 설립했다. 이 시기 칸딘스키가 동양 정신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본 심영섭의 ‘아세아주의 미술론’이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는 서양 현대미술로 서화의 정신세계를 계승·일신하려는 시도였다. 그런데 이듬해인 1929년, 대구의 한학자 집안에서 훗날 수묵 추상 운동을 전개하는 서세옥이 태어난다. 역사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가끔은 신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한 박광진·김주경, 서울에서 독학한 심영섭·장석표가 발기 회원으로 참여한 미술 단체. 최초의 본격적 양화가 그룹으로 평가받는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하기 ▼
'LOCAL'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구가 힙합 탄생 50주년을 기념하는 방식 (1) | 2025.07.09 |
|---|---|
| 정온과 합리의 도시 (1) | 2025.07.09 |
| 도시 대구의 기억법 (1) | 2025.06.27 |
| 레코드와 우리는 (2) | 2025.06.27 |
| 대구 누들 로드 (3) | 2025.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