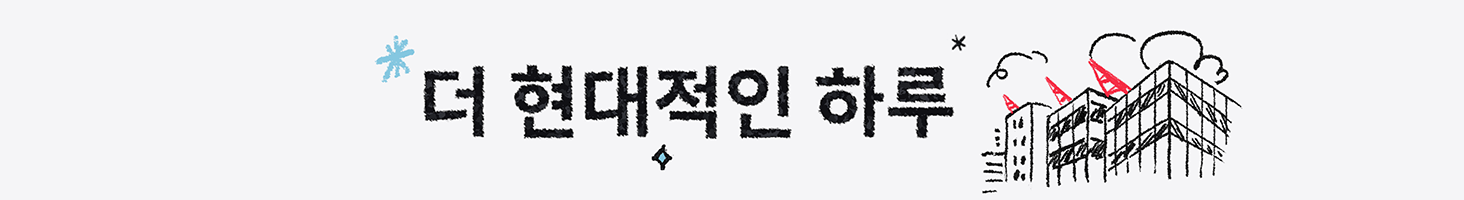하룻밤의 여행자 (1)

내게 낯선 장소란 하룻밤을 묵어보지 않은 곳이다. 하룻밤은 물리적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적 친밀감을 내포한다. 이 가을, 난생처음 대구로 여행을 간다. 마침, 서울에서의 내 일상은 휴식을 필요로 했다. 다만 그곳은 끝내 써지지 않는 글, 지루한 생활과 결별할 새로운 장소여야 했다. 여러번 지나쳐갔으나 머문 적은 없던 도시. 고속도로를 달려 경상북도로 진입하면서부터 위용 있는 산들이 에워싼다. 분지로 이뤄진 대구가 멀지 않았다는 증거다. 곧장 도심으로 진입했고 넓은 도로와 빌딩, 그 가운데서도 정겨운 근대건축물에 흘깃흘깃 눈이 간다. 1920년대에 들어선 경북대학교 병원 구관의 안온한 벽돌 건물을 지나자마자 내비게이션이 도착을 알린다.

좁은 골목 끝, 오늘의 거처인 스테이 지안의 문을 슬며시 연다. 1950년대에 지은, 제법 규모 있는 한옥. 서까래와 기둥이 듬직하게 서 있는 집은 넓은 마당을 품고 있다. 수십 년 전 한옥 안에 유럽의 빈티지 가구들이 놓여 있는 풍경은 다른 시절이 겹쳐진 절묘한 하모니로 다가온다. 거실의 가장 큰 창에 놓인 마틴 비서의 오렌지색 데이베드 소파와 그 앞을 포물선으로 지나는 커다란 램프가 어서 와 앉으라고 손짓한다. 비스듬이 누워 높은 천장을 바라보며 숨 고르기를 하는 사이, 어디선가 다가오는 아로마 향과 정갈한 플레이리스트 덕분에 잠시 나른해졌다.

마당으로 잠시 나가 귀여운 캠핑 의자에 앉아 초가을 바람을 만끽한다. 이웃들의 정겨운 말소리가 새들의 지저귐과 함께 공간을 넘나든다. 무엇을 보고, 먹고, 향유하는 것만이 여행의 묘미가 아님을. 호스트의 섬세한 배려, 손님에게 어떤 종류의 쉼을 만끽하게 할까라는 구상을 가늠해보는 것 역시 나만의 묘미다. 때론 이 지점에서 이심전심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늦은 저녁에는 목욕을 했다. 커다란 히노키에서 마당을 내다보는 것이 스테이 지안의 백미다. 명상과도 같은 시간일지 모른다. 뜨거운 물을 가득 채워 몸을 담그고 어둠만을 바라보다가 스르르 졸기도 했다. 덕분에 다음 날 아침은 일찍 찾아왔다. 새하얀 침실에 드리워진 기다란 햇살이 흔들어 깨웠다. 정신을 차릴 새 없이 아침 9시면 문자가 울리는데, 곧 도착할 조식 알림음이다. 부지런한 근처 브런치 숍에서 배달되는 조식은“따듯한 아침을 드시게 하고 싶었어요”라던 호스트의 마음씨다. 베지라구 메이드, 감자 베이글, 반숙 달걀을 톡톡 두드려 빵에 발라 먹는 외프 알라코크. 시즈 브락만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 누군가 만들어준 아침을 먹으며 시작하는 호사를 누렸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하기 ▼
'LOCAL'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화와 영화관을 둘러싼 시간에 대해 (0) | 2025.09.05 |
|---|---|
| 자연과 건축물이 빚은 시간의 여백 (0) | 2025.09.05 |
| 한 뭉티기 하실라예? (1) | 2025.08.22 |
| 대구에서 20년을 살았지만 (0) | 2025.08.22 |
| 겹겹의 기억이 도시를 짓는다 (3) |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