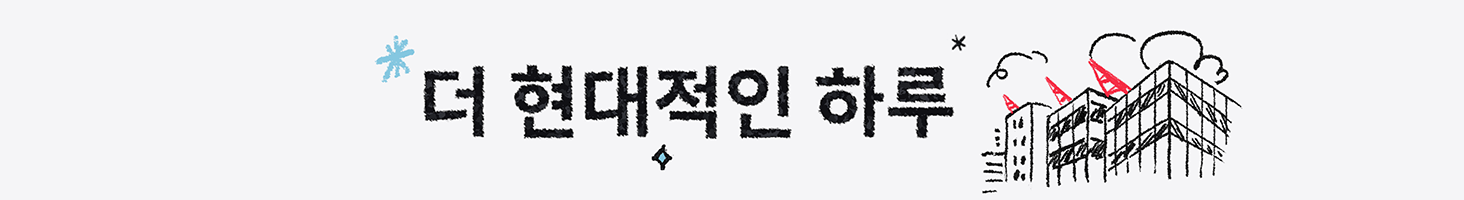노포 인 더 시티 (1)

말이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 했던가. 필자가 태어난 경주에선 서울 아니면 대구로 올라갔다. 맘 잡고 달리면 한 시간 안에 당도하는 광역시(당시엔 직할시였다)라니, 촌사람 읍내 가듯, 종종 대구에 갔다. 예전부터 유흥이 발달했다는 흥 많은 도시 대구는 그 무더위만큼이나 화끈한 면이 있었다. 맛있게 매운 떡볶이부터 지금의 치맥 페스티벌을 있게 한 양념치킨들, 대구식 육개장까지··· 음식만 봐도 “파워풀 대구, 컬러풀 대구”를 연상시키는 강렬함이 있다. 유명 식당과 카페에서도 대구를 F&B 센터로 활용한다는 말은 허언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서 요즘도 가끔, 대구에는 ‘먹으러’ 간다. 하루 세끼가, 부족한 내 위가 원망스러울 땐 차선책으로 밀려나는 요리도 있기 마련인데 뭉티기는 늘 아귀가 맞지 않아 아쉬웠다.
밥상머리 교육
“자고로 고기는 단디 익혀 무야 한다!” 밥상머리 교육은 참 무섭다. 어릴 때부터 소고기건 돼지고기건 바짝 익혀 먹어야 탈이 없다는 가르침을 받은 이래 생고기는 제아무리 육회라 해도 별로 달갑지 않았다. 생고기 먹고 탈 났다는 카더라 뉴스의 공포는 살짝 익혔을 때 맛볼 수 있는 육즙과 특유의 식감을 함께 앗아갔으니··· 고기는 씹어야 제맛이라지만 이리저리 뒤집다 풍미며 수분이 다 사라진 퍽퍽살만 먹어온 셈이다.
“미디엄 웰던이요”라고 주문하는 게 “바짝 익혀주세요”보다 멋있어 보이기 시작한 때부터, 조금씩 생고기의 맛에도 눈을 뜨기 시작했다. 곱창집에서 조금씩 내오는 간과 천엽, 그리고 육회는 내게 어른의 맛과도 같았다. 소주가 달면 어른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그처럼 양념의 잔재주 없이 재료 본연의 맛이 중요한 생고기를 먹으며 진짜 어른이 된 듯한 기분마저 느껴졌다.
그렇지만 빨갛다 못해 선홍빛에 가까운 생고기의 첫인상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심지어 이름도 뭉티기란다. 왠지 도전 욕구가 샘솟는 상대가 아닐 수 없다. 뭉티기는 뭉텅뭉텅 큼직하게 썰어낸 고기를 의미한다는 의미의 경상도 사투리로, 고기 자체의 풍미가 있어 생으로 먹어도 전혀 싱겁지가 않은데, 기호에 따라 참기름과 마늘, 고춧가루 등을 섞은 양념에 푹 찍어 먹는 게 특징이다.
하드코어의 서막, 왕서미식당
왕거미식당
1976년에 왕거미식당을 개업한 당시 별다른 조리법이랄 게 없었던 뭉티기와 오드레기의 양념을 직접 개발했다. 지금까지 그 맛을 잃지 않으며 대구 뭉티기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696-8

대구 특송이라며 가로수길에도 뭉티기 메뉴가 선보이기 시작할 때 즈음, 제일 먼저 접한 이름이 왕거미식당이다. “어쩜 여긴 이름도 왕거미야!” 뭔가 극적이고 강렬한 포스가 풍긴다. 접근성도 제법 좋다. 1976년 개업한 이래 2대에 걸쳐 운영 중이라는데, 당일 도축된 생고기만 판매한다고 한다. 부푼 가슴을 안고 달려갔다. 철이 없었죠… 맘만 먹으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음식인 줄 알았던 내 불찰이다. 입구에 사람들이 웅성이는 모습을 봤을 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오늘은 소 잡는 날이 아입니더…” 이게 웬 날벼락인가. 뭉티기는 재료의 선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음식인 만큼 매일매일 소를 잡고 손질해야 내어놓을 수 있는데, 그 점을 간과했다. 하는 수 없이 오드레기로 아쉬움을 달래본다. 오도독오도독 씹는 소리가 특이해 오드레기라고 처음 명명한 곳이 바로 왕거미식당이라니, 주인 제대로 찾아온 셈이긴 하다. 뭉티기, 오드레기… 대구는 형용사를 명사화하는 재주가 있구나.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함이 더해지는 오드레기에 소주 한잔을 곁들이며 다음을 기약해본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하기 ▼
'LOCAL'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연과 건축물이 빚은 시간의 여백 (0) | 2025.09.05 |
|---|---|
| 삼덕동에서의 하룻밤 (0) | 2025.08.22 |
| 대구에서 20년을 살았지만 (0) | 2025.08.22 |
| 겹겹의 기억이 도시를 짓는다 (3) | 2025.08.12 |
| 카이유에서 교감하는 집으로 (5) |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