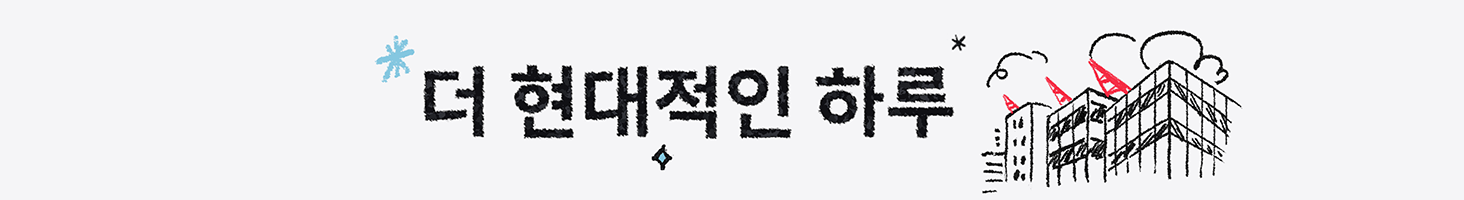청주에서 오래된 분식집을 찾다

사진이 그렇고, 노래가 그렇듯이, 냄새와 맛도 기억을 들추는 데 선수다. 실은 냄새와 맛이 더 노골적이다. 기억 속 사람을, 그 풍경을 지금 눈앞에 데려다 놓는다. 그리고 사라진다. 그래서 사무친다.
나는 충청남도 논산에서 나고 자랐다. 들깨밭 잠자리 날아다니는 시골인가 하면, 달라스 햄버거가 있는 시내까지 요이 땅! 달려갈 수 있었고, 한 시간쯤 버스를 타면 대전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닿았다.
그리고 청주. 청주는 대전보다 먼 곳이라 했다. 아마도 1983년, 큰누나가 청주교대에 입학해 집을 떠났을 때, 청주라는 지명을 처음 들었을 것이다. 큰누나와 나는 열두 살 차이. 그땐 도무지 지금 같지 않아서, 집 떠난 누나의 소식을 잘 알 수 없었다. 나는 편지를 썼고, 누나는 답장을 보냈다. 누나가 보낸 편지들을 나는 간수하지 못했는데, 누나는 그때 내가 보낸 편지들을 간직하고 있다.


누나가 청주 오성당이라는 곳에서 ‘고로케’를 먹었다고 얘기한 건 편지에서일까, 아니면 방학 때 집으로 돌아와 들려준 이야기일까. 나는 그때 고로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 누나의 말대로라면,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것은 실로 굉장한 맛이어야 했다. 1985년 겨울, 나는 엄마가 떠준 수박색 스웨터를 입고,농구공을 들고 학교에 가면서, 고로케를 떠올린 적이 있다.
늘 이런 식이다. 맛은 기억을 잘게잘게 조각낸다. 그리고 하나하나 반짝이도록 끌어낸다. 40년이 지난 2025년 봄, 청주로 가면서 나는 논산에 있는 누나에게 오성당 고로케를 포장해 갈 생각으로 들뜬다.

오성당은 버스터미널로부터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다. 아침 10시 반, 고로케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 문을 여는데, 창밖에서 들여다보니 과연 쟁반 가득, 갓 튀겨낸 고로케가 쌓여 있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하기 ▼
'LOCAL'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초콜릿과 병과, 스트리트 디저트 (2) | 2025.08.12 |
|---|---|
| 잘 볶은 커피, 오래된 식당, 가마솥 (4) | 2025.07.30 |
| 스쳐 지나가기에는 아까운 도시 - 윤광준 작가가 찾은 청주 (4) | 2025.07.30 |
| 불멸의 공예가 피어나는 청주 (0) | 2025.07.24 |
| 청주의 조용한 부상 (0) | 2025.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