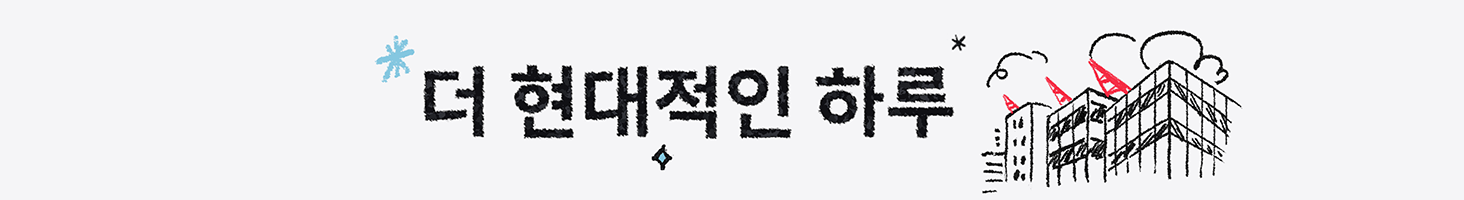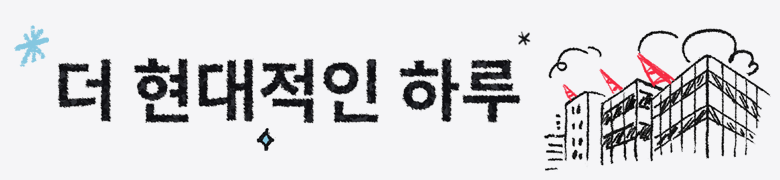청주의 맛

청주淸州는 이름 그대로 ‘맑고 깨끗한 고장’이다. 청주 시내를 흐르는 무심천이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乾川에 가까운 점에서 보듯, 청주는 물이 풍부하기보다는 맑고 청명한 땅으로 보인다. 청주의 음식은 지역의 자연과 비슷한 데가 있다. 화려하지 않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은근히 깊게 보여준다.
인구 90만에 육박하는 청주는 음식의 수와 외식 규모가 인구수에 맞게 발달했다. 미호천이 범람하면서 생긴 미호 평야는 청주시 일부와 청원군, 충남 연기군 등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수량이 풍부하고 경지 정리가 잘되어 있어 곡창지대를 형성한다. 1530년에 쓰인 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청주의 땅이 기름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쌀의 원생지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1만5000년 전의 볍씨가 청주 옥산면 소로리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청주의 음식은 지역의 자연과 비슷한 데가 있다.
화려하지 않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은근히 깊게 보여준다.
내륙 지방 특유의 장문화
1913년에 청주군 상신리現 강서2동의 한 집안에서 작성한 조리서 〈반찬등속〉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청주 지역의 음식 문화가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조선의 이전 조리서에 비해 고추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현재 청주의 식당 곳곳에서 고추짠지나 고추짠지 다대기를 찾아볼 수 있어 〈반찬등속〉의 조리법이 지금의 청주 외식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찬등속〉에는 짠지가 여덟 종류나 등장하는데, 그 이유는 청주가 내륙 지방이라는 데 있다.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내륙에서는 식재의 보관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장 문화 발달이 필연적이다. 청주는 콩의 품질과 생산량이 높은 지역이었으며, 이런 배경으로 말미암아 콩으로 만든 간장에 절인 짠지를 많이 먹었다. 〈반찬등속〉에서는 고추장을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 설탕을 넣는 조리법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청주의 해장국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고추장을 넣는 집이 제법 있다.
청주는 콩의 품질과 생산량이 높은 지역이었으며,
이런 배경으로 말미암아 콩으로 만든 간장에 절인 짠지를 많이 먹었다.
청주의 대표 외식, 올갱이국
올갱이는 다슬기의 충청도 사투리다. 청주의 올갱이국에 들어가는 올갱이는 정확히는 베틀올갱이다. 1970년대 중·후반, 청주에는 올갱이국을 전문으로 파는 곳이 서문시장 내에 세 군데 있었다. 1977년 8월 9일 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상주집’이다. 상주집은 서문시장 근처에서 여전히 영업 중인 곳으로, 청주 내에서도 노포 중의 노포로 꼽힌다. 육거리 시장이 청주의 중심이 되면서 한때 13개나 되던 서문시장의 올갱이 전문점은 타격을 받으며 상주집 한 집만 남고 모두 문을 닫았다. 가게 안에는 향토음식업소 지정 현판이나 지정서가 여럿 걸려 있다. 식당의 정식 명칭은 ‘상주올갱이집’이다. 50여 년 전, ‘올갱이 할머니’로 불리던 김월임 씨가 작고한 뒤 딸 김순열 씨가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메뉴는 올갱이국과 올갱이무침 두 개다. 국은 된장을 기본으로 한 구수한 국물에 올갱이와 부추가 오래된 노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직접 담근 된장, 열무김치, 깍두기에 짠지고추김치, 짠지고추김치 다대기가 딸려 나온다. 국물이 순하고 깊다. 강하지 않은 청주 음식의 근간을 지켜온 맛이다. 이전에는 충주 지방의 남한강과 괴산의 괴강에서 잡아온 올갱이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충주댐이 생기면서 남한강 상류인 강원도에서 잡아온 것을 쓴다. 올갱이국은 올갱이를 물에 담가 해감한 뒤 끓는 물에 15분쯤 익혀 건져내 국물에 된장을 풀고 계절에 맞는 채소와 부추 양념을 넣고 끓여낸다. “올갱이국 한 그릇이 인삼 한냥쭝과 같다”(1976년 10월 14일 자 〈경향신문〉)는 말처럼 청주인들에게 올갱이국은 건강과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이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하기 ▼
'LOCAL'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멸의 공예가 피어나는 청주 (0) | 2025.07.24 |
|---|---|
| 청주의 조용한 부상 (0) | 2025.07.24 |
| 내장 굽는 고을 (0) | 2025.07.18 |
| 대구에 관한 몇 가지 오해 (0) | 2025.07.18 |
| 붉은 국물의 본향 (2) | 2025.07.18 |